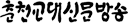현재 한국에는 제로-칼로리 음료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의 등장 이후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소비자들의 생각이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1] 2021년의 ‘펩시콜라-제로’와 ‘칠성사이다-제로’를 시작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온 제로-칼로리 음료는 사람들에게 “칼로리가 적으니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거야.”, “열량이 높지 않으니 건강에도 좋겠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자회사의 음료수를 제로-칼로리 버전으로 새로 출시하며 다양한 노선을 물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제로-칼로리에는 호평만 쏟아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많은 회사에서 모든 음료를 제로-칼로리로 바꾸지 않을까?
‘제로 슈거 콘셉트’는 인공감미료의 활용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제로-칼로리 연구는 동아오츠카의 나랑드 사이다를 시작으로 잠깐 활발했지만, 소비자들을 사로잡지 못한 맛 문제로 무산되었다. ‘제로 슈거 붐’이 제대로 있기 전까지 제로-칼로리는 생수, 차, 우유가 미포함된 커피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로 슈거의 열풍으로 그 종류가 차차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로-칼로리 음료가 마냥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로-칼로리 음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칼로리를 억제하기는 커녕 식욕을 끌어올린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원인에는 인공감미료가 신체의 ‘영양 혼란’을 일으켜 더욱 음식을 고프게 한다는 것이었다.[2] 결국, 이는 제대로 된 식단 조절이 없이는 제로-칼로리 음료만으로 다이어트의 효과를 누리기 힘들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인공감미료는 아직 연구 중이며, 확실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느낄 뿐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한계이다.
제로-칼로리 음료수, 그러면 먹지 말라는 소리일까? 그건 아니다. 대신, 적당량만 지켜 섭취하면 된다.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의 대표적인 예시인 ‘코카콜라 제로’를 기준으로 하루 섭취 기준량에 비교해본 결과, 41병을 먹어야 최고 기준에 도달할 정도이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하루에 한 병 정도는 신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인공감미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각 사람이 느끼는 신체 변화에 따라 적절히 평가하고 섭취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으로 제로-칼로리 음료의 발전은 무궁무진해질 것이다. 또한 제로-칼로리 음식도 등장할 예정이다. 더욱 나아질 제로-칼로리의 전망을 바라보아 효율적이고 바른 섭취를 위해 노력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