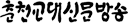길
이종건
진흙길에 선명하게 새김질된 바퀴자국을 보았다.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열상 같기도 하고
검은 바다 생물의 비늘 같기도 하다.
뒤에 남겨진 것들은 무엇이건
주인의 냄새가 깃들어 있기 마련이지
저 패인 자국에서도 보이지 않는 한숨과도 같은
대기의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해거름에 나타난
저 길 위에 무수한 자국들
생활의 신산한 이야기들이 끈적한 땡볕에 말라붙어
불규칙하고 어지러운 무늬를 드러낸다.
점점이 체액을 떨어뜨리며 나아간다.
달팽이가 점액을 문지르며 나아가듯
사람들이 자신을 일부를 놓아버리고,
잃어버리며 길을 지난다.
뒤에 남겨진 것들은 무엇이건
주인의 냄새가 깃들어 있기 마련이지
가만히 길바닥에 손을 대고
내 심장의 떨림을 가늠해 본다.
가을
이종건
가을은 바람이 만든다.
북쪽 찬바람을 끌어와 부지런히 나무와 개울을 말리고
과실과 곡식의 낱알에 몸을 뉘였다가 더러 뜨거운
각혈을 온 산에 뿌린다.
미처 날아가지 못한 새의 깃털과 함께
높은 하늘로 솟구쳐 새하얀 구름을 만들기도 한다.
지나간 계절 나태함에 굴복한 자는
풍성한 열매대신 눈물을 수확하고
다가오는 혹독한 계절을 향하여 치를 떤다.
그대여!
그대는 준비된 자인가!
쌀 한 톨에서 햇살과 미풍, 천둥과 비바람을
볼 수 있는 그대만이 다가오는 계절의 살벌함에
대항할 수 있다.
백년의 나무가 씨앗하나에서 비롯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을 안에서
겸허함을 새긴다.
강
이종건
강물이 흐른다.
물비늘이 반짝인다.
물속엔 때 묻은 침전물들이 있다.
물살을 따라 흘러가다가 강바닥에 깊은 상흔을 남기기도 한다.
끊임없이 끌려가며 물살을 잡아챈다.
때때로 남몰래 숨겨 놓은 조약돌 하나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곧 부옇게 흙먼지를 피우는 부유물들로 이내 사라진다.
어린 물살들을 달래며 지친 몸을 이리 저리 뉘인 채
강물이 흐른다.
누더기가 되어서도 가야 하기에
제 몸을 부수어 가며 세상에 섞여 강물이 흐른다.
뒤도 못 돌아 본 채 떠나가는 강물.
아버지의 가슴에 흐르는 강.
눈 내리는 날
이종건
눈이 내린다.
내가 걸어온 흉터같은 발자국을 지우며
하얗게 쌓인다.
나는 홀린 듯이 미아처럼 걷는다.
눈이 내린다.
걷다 보면 얼어 죽은 동물의 주검을
만나기도 한다.
참혹한 위로 순백의 눈이 쌓일 때
잠시 고개를 숙이고 정적에 잠긴다.
짧은 사이, 벌떡거리는 생명의 심장을 언뜻 본 듯도 하다.
영원에의 동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그 간극 사이로
무표정하게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어쩌면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나온 길은 잘 개켜 세월의 서랍장에 얹고
다시 나만의 발자국을 빚어야 한다.
눈물도 가시덤불도 다 잠재우고 덮으며
눈이 내린다.
축복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