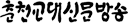적과 녹
_최재혁
여자들은 갈맷빛 립스틱을 바르고 창밖 너머 노을은 풀빛으로 진다. 가끔씩 새빨간 입술을 하고 하늘을 발갛게 물들일 뿐이다.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가 아니고 세상은 망가졌고 교과서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사과는 빨강에서 초록으로 익는다는 그 한 마디조차.
세상은 빨강, 초록, 파랑으로 이루어져있다. 파랑만이 굳건히 굽이치는 가운데 빨강과 초록은 기묘하게 겹쳐서 날 어지럽게 만든다. 주황과 연두, 갈색과 진녹도 변검을 부리듯 모습을 자꾸만 바꾸고 나를 희롱한다. 장미꽃은 신록으로 우거졌다가 불꽃처럼 뻘겋게 피어오르고, 이내 환상이었다는 듯이 화려한 자태를 숨긴다.
시각은 사고를 파고든다. 시각은 세계를 바라보는 기관의 감각이다. 사고는 그를 둘러싼 세계가 구축한다. 그리고 색깔은 시각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적과 녹이 뒤엉킨 세계를 살며 나의 사고도 일그러졌음은 물론이다. 거짓말은 왜 새빨갛고, 셰익스피어는 어째서 이아고의 입을 빌려 질투는 녹색 눈을 한 괴물이라고 말하였는가. 색깔에 관한 의문은 언어에 관한 의문으로, 이윽고 세계에 대한 의문으로 번져갔다.
사고는 시각을 구성한다. 사고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시각은 세계를 바라보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세계는 색채를 갖고 실재한다. 그러나 색채의 불확실성은 곧 실재의 불확실성을 의미했다. 세계는 내 일그러진 사고만큼 아스러져 보인다. 논리학에서는 애매와 모호 각각이 A일 수도 B일 수도 있는 것, 기준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적과 녹을 넘나드는 세계는 내게 애매하다.
간호사는 덧없이 솔직하다. 백의를 입고 있기 때문일까. 교과서는 순 거짓투성이라고 여기고 있던 열일곱 살의 나에게 간호사는 ‘진짜’ 진실을 귀띔해주었다. 세상은 망가지지 않았다고. 망가진 것은 오로지 내 눈뿐이라고. 사과는 언제나 초록에서 빨강으로 익는다고.
색채의 확실성은 실재의 확실성을 보증한다. 색채의 불확실성이 실재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듯이. 세계는 분명한 색채를 갖고 실재한다. 빨강과 초록이 뒤엉켜있지도 뒤집혀있지도 않다. 내가 봐왔던 세계는 실제 세계의 환영에 불과했다.
나는 일생토록 죄수인 셈이다. 내가 믿었던 세계는 적과 녹이 계속해서 뒤바뀌는 환상이었다. 세계는 그런 환상 속에 갇혀 살라고, 태어나기도 전의 내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것이다. 간호사의 말 덕에 나는 나의 옥살이를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죄목은 알지 못했다.
죄목이라, 궁금하지 않다. 내가 진정 알고 싶은 건 내가 존재하는가, 그것뿐이다. ‘세계는 색채를 갖고 실재한다. 그러나 색채의 불확실성은 곧 실재의 불확실성을 의미했다.’ 색깔을 잃어버린 나는 실재하는가? 의심의 눈초리를 세계에서 스스로에게 돌렸을 때,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진한 색깔―검정색 고독으로 곤두박질쳤다.
수년이 흘러 색깔을 잃어버린 나는 색깔을 탐하기 시작했다. 2B연필을 내려놓고 색연필을 들었다. 결핍은 욕망을 낳는다는 흔한 말처럼 나는 빨강과 초록의 정체를, 세계의 색채를, 나의 실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림은 어느새 존재를 향한 몸부림이 되었다.
회화란 시각의 산물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연필로만 그림을 그려왔다. 간호사의 말을 듣기 훨씬 전부터. 나는 많고 많은 재료 중에 왜 연필을 골랐을까. 적과 녹이 일그러뜨린 세상에서 도망쳐 찾은 유일한 불변의 빛깔이 무채색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흑과 백은 언제나 진실하니까. 초록색으로 작열하는 노을을 보노라면 추측은 빠르게 확신이 되어갔다.
하지만 한편으로 회화는 사고의 산물이기도 하다. 나는 연필을 들며 무채색에 진실성을 투영했다. 그러나 그것은 색채가 불확실해 실재도 불확실할까봐 염려하며 했던 사고가 아니던가. 시각이 사고를 파고들어 모노톤의 세상을 그리게 되었지만 이는 사고가 시각을 구성하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시각은 눈의 감각이고 사고는 뇌의 감각이다. 그리고 두 감각의 주체는 바로 나다. 즉 시각과 사고를 내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과 사고가 나를 조작했었듯이. 그렇다면 시각이 사고를 파고들고 사고가 시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반대로 사고가 시각을 파고들고 시각이 사고를 구성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가.
이제 나의 그림은 흑과 백의 세계에 있지 않는다. 간호사의 말을 듣고 내가 세상의 세 가지 빛 중 두 가지를 잃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모든 빛을, 그리고 나의 존재를 잃을까봐 불안과 절망에 골몰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진실함이 흑과 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적과 녹에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적과 녹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세상 앞에 마주 서서, 종이를 색칠하듯 세상을 색칠했다.
이제야 세계의 색채가 보인다. 사과는 빨강에서 초록으로 익다가도 내가 원하면 초록에서 빨강으로 익는다. 여자들의 갈맷빛 입술은 어여쁜 붉은 입술로 바뀌고 해질녘 풀빛의 하늘은 뻘겋게 물들어간다. 이 모두 나의 사고가 시각을 파고든 덕이다.
비로소 나의 실재도 보이기 시작한다. 아스라이 보이던 나의 모습이 거울처럼 내 앞에 있다. 세상의 색깔에 희롱당한 이는 온데간데없고 세계의 색채를 변주하는 자가 웃으며 있다. 결코 흐릿하지 않은 그의 웃음을 보고 나는 안도한다. 나는 색채를 갖고 실재한다. 세계가 색채를 갖고 실재하는 것처럼. 시각이 사고를 구성하는 순간이다.
언젠가 간호사는 내 눈이 망가졌다고 했었다. 맞는 말이다. 그 말은 그의 백의만큼 진실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내 눈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내 눈은 남들이 결코 보지 못할 것을 보는 눈이었던 것이다.
내 눈은 푸르른 여름날, 단풍을 보는 눈이다.